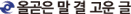속리산 탈골암(脫骨庵)을 찾아서
지난 주말에는 약속이 있었다. ‘충북, 청주’ 하면 으레 속리산을 떠올리는 서울 사람들이 머리도 식힐 겸 놀러오겠다고 해서 잡은 약속이었다. 하지만 일상을 떠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루 전 취소 연락을 받았다.
어차피 나로서는 겸사겸사 잡은 일정이었다. 모처럼 여럿이서 떠나보려나 했더니 이번 여행도 역시 혼자다. 속리산 입구 오리 숲에 들어서니 여느 때와는 달리 좀 쑥스럽다. 주말이라선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을 찾아온 이들이 꽤 많다. 주눅이라도 드는 것일까? 왠지 발걸음이 씩씩해지지 않는다. 어느덧 따가워진 햇살을 가려주는 깊은 그늘도 반갑지 않다.
참나무와 전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이 오리 숲은 법주사 보물과 국보만큼이나 귀하게 대접받는다. 일주문이 저만치서 혀를 끌끌 차며 어리석은 중생을 내려다보고 서있다. 숲에 왔으면 나무에 기대고, 산에 왔으면 산에 그냥 안길 일이지, 쯧.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걸어 가리라던 호기는 대체 어디 두고 왔는가?
다시 허리를 곧추 세운다. 숨을 깊게 들여 마신다. 일주문의 독경 소리가 멀어져 갈 즈음 새소리가 가깝게 들려온다. 4음절 운율 고운 검은등뻐꾸기 소리가 맑다. 오리 숲 끝나는 지점에 수정교가 있는데 그 너머로 법주사 금강문이 보인다. 갈림길에서 잠깐을 망설인다. 속리산 쪽으로 계속 더 들어갈까. 법주사는 꽤 익숙한 곳이니 사진 몇 장 찍고 그만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승계에 있든 속계에 있든, 깨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바람이 아닐까. 또 역설적이게도 그 깨달음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피하고 싶어 한다. 이 또한 본능이다.
갈림길에서 망설이는 건 나의 나쁜 습관이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더 편하고 만만한 길을 선택하는 건 더 나쁜 버릇이다. 오늘만 해도 그렇다. 처음 길 떠날 때 내심 정해둔 목적지는 탈골암이었다. 탈골암은 닭처럼 생긴 신라 김알지의 얼굴을 낫게 한 곳으로 유명하다.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이야기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진표 율사가 처음 속리산에 와서 이 곳에 암자를 짓고 제자들이었던 영심, 융종, 불타 등과 수도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케 했다 하여 탈골암으로 불렀다고 전한다. 그래서일까. 이 곳 약수가 아주 효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해탈을 쉽게 한다고 소문이 나있다.
승계에 있든 속계에 있든, 깨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바람이 아닐까. 오늘 내가 탈골암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깨달음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피하고 싶어 한다. 이 또한 본능이다.
갈림길에서 처음 마음먹은 대로 탈골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몇 걸음 앞서 가던 젊은 연인들이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간다. 아름답다. 부럽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데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닌 모양이다.
“......그 때 처음 손을 잡았는데, 손에 땀이 잔뜩 났더라구....”
“하하....과장님 손이요?.....”
마주 오는 중년의 등산객들이 옛 추억담을 주고받는다. 여행은 추억을 만들기도 하지만, 빛바랜 필름을 재생시키는 기능도 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들기도 하지만, 빛바랜 필름을 재생시키는 기능도 있다.
숲가에 뭔가 어른거린다. 다람쥐보다는 큰 것이다. 걸음을 좀 빨리 해본다. 사라졌다. 숲 안쪽을 올려다보니 파란불 두 개가 있다. 숲 그늘 짙은 어둠 속에서 검은고양이의 두 눈만 파랗게 빛난다. 쭈뼛 머리카락이 일어선다. 마침 탈골암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서있다. 0.9KM라고 써있다. 가파른 황톳길을 두 구비쯤 돌아가니 높다란 축대위에 꽤 큰 절집이 앉아있다. 생각보다 크다.
주 법당도 크고, 요사채도 크다. 대개 암자라고 하면, 작은 법당 한 채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상을 빗나간다. 탈골암도 실은 법주사에 딸려 있는 암자이다. 그런데 그 본래의 뜻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 이유는 이 암자가 지난 1993년에 화재를 입었고 곧바로 불사를 시작해 1995년에 새로 지은 데에 있다.
탈골암의 주 법당은 약사전이다. 보통 절의 대웅전처럼 주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다. 다만 이곳에 모신 부처님이 약사여래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약사전 안에는 약사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협시하는 삼존상이 모셔져 있다. 관음, 지장은 대체로 아미타여래상을 협시하는데 여기서는 아미타상 대신에 약사여래상이 모셔진 셈이다. 그래서 약사전의 세 부처님 모두 손에 여의주나 약병을 들고 계시다.
약사전 부처님을 돌아보고 나서 절 뒤편으로 가본다. 탈골암은 어린 아이들이 오면 재미있어 할 것 같다. 산비탈에 절이 앉아있어 건물들을 산 쪽으로 들여 지었는데, 앞채와 뒤채 사이를 조그마한 토방(토굴)들이 층층으로 아기자기하게 채우고 있다.
입가에 절로 고이는 흥미를 카메라에 담은 후, 뒷마당으로 올라섰다. 스님들이 소리 없이 절 건물을 빙빙 돌고 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다. 사진 한 장 찍었다가 곧바로 제지를 당한다. 알고 보니 뒷마당 자체를 올라가지 않는 게 선방의 규칙이었다. 탈골암의 선방 이름은 대휴선원이다. “크게 쉰다”라는 뜻이다.
꼼짝없이 두 시간을 절 안마당에서만 있어야 한다. 툇마루에 쪼그리고 앉는다. 약사전 앞 마당에서 뜨겁고 고요한 햇빛을 받고 서있는 탑이 눈에 띤다. 왜 이제야 눈에 띄었을까? 커다란 절집들과 어울리지 않게 작다. 신식아파트 널따란 거실에 낡은 뒤주가 놓여 있는 것 같다. 게다가 탑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 자체가 제 짝이 아니다. 주변 여기저기에서 모아다 놓은 것이다. 재활용탑이라고나 할까. 또 그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심지처럼 마당에 박혀있다. 바위 가운데 우묵한 작은 연못에서는 수련이 망울지고 있는데, 그 또한 정겨운 풍경이었다.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기쁨이 이룩해 내는
엄청난 역할이 놀랍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
큰 바위 작은 연못을 보고 있으니 절집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아래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탈의 효험이 있는 우물이 있고, 크게 쉴만한 원력이 있는 절이라서 일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산 아래 사람들이 올라온다.
나도 약수 한 그릇에 소원 하나는 빌어봐야겠다. 살림 하나 없던 암자가 큰 집으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 바랄 테니, 뼛속 깊은 아픔 속에서도 다시 걸어 나갈 용기만 주소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어차피 나로서는 겸사겸사 잡은 일정이었다. 모처럼 여럿이서 떠나보려나 했더니 이번 여행도 역시 혼자다. 속리산 입구 오리 숲에 들어서니 여느 때와는 달리 좀 쑥스럽다. 주말이라선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을 찾아온 이들이 꽤 많다. 주눅이라도 드는 것일까? 왠지 발걸음이 씩씩해지지 않는다. 어느덧 따가워진 햇살을 가려주는 깊은 그늘도 반갑지 않다.
참나무와 전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이 오리 숲은 법주사 보물과 국보만큼이나 귀하게 대접받는다. 일주문이 저만치서 혀를 끌끌 차며 어리석은 중생을 내려다보고 서있다. 숲에 왔으면 나무에 기대고, 산에 왔으면 산에 그냥 안길 일이지, 쯧.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걸어 가리라던 호기는 대체 어디 두고 왔는가?
 | ||
| ▲ 약사전 뒤편의 大休선원. 선방에 들어서는 수행자 모두가 안으로는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밖으로는 구하는 마음을 쉬어, 일체 번뇌의 뼈를 벗어버리게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 ||
승계에 있든 속계에 있든, 깨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바람이 아닐까. 또 역설적이게도 그 깨달음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피하고 싶어 한다. 이 또한 본능이다.
갈림길에서 망설이는 건 나의 나쁜 습관이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더 편하고 만만한 길을 선택하는 건 더 나쁜 버릇이다. 오늘만 해도 그렇다. 처음 길 떠날 때 내심 정해둔 목적지는 탈골암이었다. 탈골암은 닭처럼 생긴 신라 김알지의 얼굴을 낫게 한 곳으로 유명하다.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이야기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진표 율사가 처음 속리산에 와서 이 곳에 암자를 짓고 제자들이었던 영심, 융종, 불타 등과 수도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케 했다 하여 탈골암으로 불렀다고 전한다. 그래서일까. 이 곳 약수가 아주 효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해탈을 쉽게 한다고 소문이 나있다.
 | ||
| ▲ 계단식으로 배치한 토굴과 장독대 | ||
갈림길에서 처음 마음먹은 대로 탈골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몇 걸음 앞서 가던 젊은 연인들이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간다. 아름답다. 부럽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데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닌 모양이다.
“......그 때 처음 손을 잡았는데, 손에 땀이 잔뜩 났더라구....”
“하하....과장님 손이요?.....”
마주 오는 중년의 등산객들이 옛 추억담을 주고받는다. 여행은 추억을 만들기도 하지만, 빛바랜 필름을 재생시키는 기능도 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들기도 하지만, 빛바랜 필름을 재생시키는 기능도 있다.
숲가에 뭔가 어른거린다. 다람쥐보다는 큰 것이다. 걸음을 좀 빨리 해본다. 사라졌다. 숲 안쪽을 올려다보니 파란불 두 개가 있다. 숲 그늘 짙은 어둠 속에서 검은고양이의 두 눈만 파랗게 빛난다. 쭈뼛 머리카락이 일어선다. 마침 탈골암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서있다. 0.9KM라고 써있다. 가파른 황톳길을 두 구비쯤 돌아가니 높다란 축대위에 꽤 큰 절집이 앉아있다. 생각보다 크다.
 | ||
| ▲ 탈골암. 역시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으로 약사전이 주법당이다. | ||
탈골암의 주 법당은 약사전이다. 보통 절의 대웅전처럼 주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다. 다만 이곳에 모신 부처님이 약사여래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약사전 안에는 약사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협시하는 삼존상이 모셔져 있다. 관음, 지장은 대체로 아미타여래상을 협시하는데 여기서는 아미타상 대신에 약사여래상이 모셔진 셈이다. 그래서 약사전의 세 부처님 모두 손에 여의주나 약병을 들고 계시다.
약사전 부처님을 돌아보고 나서 절 뒤편으로 가본다. 탈골암은 어린 아이들이 오면 재미있어 할 것 같다. 산비탈에 절이 앉아있어 건물들을 산 쪽으로 들여 지었는데, 앞채와 뒤채 사이를 조그마한 토방(토굴)들이 층층으로 아기자기하게 채우고 있다.
입가에 절로 고이는 흥미를 카메라에 담은 후, 뒷마당으로 올라섰다. 스님들이 소리 없이 절 건물을 빙빙 돌고 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다. 사진 한 장 찍었다가 곧바로 제지를 당한다. 알고 보니 뒷마당 자체를 올라가지 않는 게 선방의 규칙이었다. 탈골암의 선방 이름은 대휴선원이다. “크게 쉰다”라는 뜻이다.
 | ||
| ▲ 마당에 심지처럼 박혀있는 큰 바위의 우묵한 작은 연못에서는 수련이 망울지고 있다. | ||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기쁨이 이룩해 내는
엄청난 역할이 놀랍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
큰 바위 작은 연못을 보고 있으니 절집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아래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탈의 효험이 있는 우물이 있고, 크게 쉴만한 원력이 있는 절이라서 일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산 아래 사람들이 올라온다.
나도 약수 한 그릇에 소원 하나는 빌어봐야겠다. 살림 하나 없던 암자가 큰 집으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 바랄 테니, 뼛속 깊은 아픔 속에서도 다시 걸어 나갈 용기만 주소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