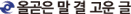청주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참여…“1층이 소리 제일 좋다”
한 교수는 “공간의 형태, 재료의 재질과 배치에 따라 소리를 다루는 분야”라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국내외 유명한 공간들의 건축음향을 담당했다. 가깝게는 청주예술의전당을 리모델링할 때 건축음향 분야를 설계했고, 서울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통영국제음악당, 안산시 문화예술회관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인천공항의 제1터미널, 제2터미널의 경우는 당시 다리가 놓이지 않아 배를 타고 들어가 작업을 했다고 한다.

특히 2008년 부산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치될 때는 국악기가 내는 음의 파장을 분석한 후 직접 설계에 반영했다. “그동안 서양악기를 기준으로 한 공간설계가 기준이었죠. 국립국악원 분원은 국악기를 갖고 실험한 후 반영한 첫 사례였죠. 일단 국악기는 음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대가 크면 안 돼요.”
그는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83년 대학원에서 처음 음향설계 분야를 접했다. “당시 우연찮게도 교과부가 음향기자재를 수입해 실험해보라는 과제가 대학원실에 주어졌고,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나서게 된 거죠. 공연장의 음향을 측정하는 장비였는데 2~3개월 씨름하다보니 저절로 익혀지더라고요.”
이후 박사과정은 우리나라에서 밟을 곳이 없어 뒤늦게 88년 호주 시드니로 유학을 갔다.
유학을 가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해외공연장들의 컨설팅을 담당했다. 박사과정을 마친 후 94년 1월 충북대에 부임해 18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지금은 음향설계 분야가 발전해 제자들은 음향설계만을 다루는 전문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립 공연장에서 음향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건축음향은 소리를 매개로 건축하는 것이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해요. 음향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 과학,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컴퓨터도 잘 다뤄야 하죠.” 그는 지금까지 대학원생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다. 18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논문만 140편을 냈고, 음향분야 특허도 8건 정도다.
국내외 공연장과 공간들을 둘러 본 한 교수. 가장 인상적인 공간에 대해 묻자 그는 체코의 ‘드보르작 공연장’을 꼽았다. 또한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은 자신이 직접 리모델링한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아내이자 소프라노인 박미경 씨가 재개관무대에 오른 것이다.
그렇게 소리와 공간은 그의 인생을 이루는 근간이다. 그런데 음향 설계가 아름다운 소리만을 내기 위해 충실한 것이 한 축이라면 반대 축은 시끄러운 소리를 어떻게 잡아내느냐를 연구하는 것이다.
인터뷰 전화를 하자 한 교수는 먼저 “층간 소음 때문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이 왔다. 그는 층간 소음 분야에 있어서도 권위자다.
한 교수는 이미 이와 관련해 ‘라텍스 폴리머’라는 신소재를 콘트리트에 첨가하면 시끄러운 소리를 흡수한다는 논문을 냈고, 특허신청을 해 놓았다. 하지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용화는 안 되고 있다고.(?)
그는 층간소음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한다. “아파트 입식생활을 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좌식생활을 하죠.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해요. 아파트에 카페트를 다 깔아놓으면 해결되죠. 또는 건축자재가 두꺼워지면 되는 데 이러면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꺼리게 돼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거나 공사비를 올리는 것 둘 다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일 강화된 기준을 갖고 있다. 바닥두께가 21cm이어야 한다. 과거 12cm에서 계속 두꺼워진 셈이다.
그는 소리를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한국의 교실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교사의 말이 잘 들리는 지 연구 중이다. 실제 교사 목소리가 잘 들리는 교실이 성적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한 교수는 “무대 개념이 없는 공간이 앞으로 등장할 꺼에요. 다차원적인 공간을 갖는 새로운 공연장을 구상하고 있어요”라고 귀띔했다.
지금은 건물을 짓기 전에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알려주는 ‘가청화’기술이 통용되고 있다. 그는 “대공연장에서 좌석을 클릭하면 실제 공연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지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벌이고 싶어요. 그러면 관객이 직접 소리를 듣고 택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네요”라고 웃었다. 소리의 질이 표 값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그래도 그가 직접 리모델링한 청주예술의전당은 1층이 소리가 제일 좋다고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