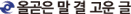육거리시장서만 36년, ‘가위손 박병권씨’
| 충청리뷰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저술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지역탐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 수동’을 출간한데 이어, 2006년 11월에도 ‘청주를 파는 육거리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청주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유통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자생의 길을 열어가는 육거리시장에 대한 탐구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원고 가운데 일부를 ‘육거리시장 사람들’이라는 제하에 나누어 싣는다. / 편집자 |
삶이 속절없이 흘러감을 흔히 ‘주마등’에 비유한다. 촛불의 온도에 의한 대류현상으로 등(燈) 속의 원반이 돌면서 마치 말이 질주하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는 주마등이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돌이킬 수 없는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다.
육거리시장 친구이발관의 이발소 회전등도 그렇게 36년을 쉴새없이 돌고있다. 이립(而立)의 나이에 이발가위를 들고 육거리시장에 자리를 잡은 이발사 박병권씨(66)가 이제 종심(從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한 생이 여기서 해 뜨고 저무는 셈이다.
그러나 박병권씨는 아직도 정년을 모르는 현역 이발사다. 서서하는 가위질에 손이 시리고 무릎도 저리지만 잊지 않고 찾는 단골들이 끊이질 않아 오전 7시면 어김없이 친구이발관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오래된 이발기, 가위, 물뿌리개, 거품솔과 함께 박씨의 가위질에 관록은 붙어가건만 사실 손님의 숫자는 예전 같지가 않다. 더러는 장강의 앞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주택가 곳곳에 자리잡은 미용실이 이발인구를 상당 부분 잠식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박씨의 이발관은 늘 붐빈다. 시장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육거리시장을 주름잡던 왕년의 장꾼들이 낮이면 박씨의 이발관을 찾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저물녘이면 마치 파장 무렵처럼 주섬주섬 하루의 일상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장마가 끝나고 푹푹 삶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6년 8월 초순에도 취재를 하기 위해 찾아간 박씨의 이발관은 이야기 손님들로 붐볐다. 청주시 용암동에서 온 단골 손님이 머리를 깎고 자리를 뜨자 이번에는 멀리 보은군 회인에서 온 손님이 이발관을 찾았다. 머리를 깎으러 온 이발 손님이 아니라 순수한 말벗이었다.
 | ||
| ▲ 박병권씨의 이발관을 찾는 손님들은 모두 단골들이다. 언제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박씨의 이발관. / 사진 =육성준 기자 | ||
친구이발관의 전성기는 주인공이 살아있는 생생한 전설이다.
“장사를 시작하고 한 15년은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빴다”는 것이 박씨의 회고담이다.
박씨는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나마도 바쁘면 어쩔 도리 없이 굶어야했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잠이 부족해 늘 졸음에 시달렸고 깜빡 졸면서 면도를 하다가 손님의 생살을 베는 일도 잦았다고.
그 중에서도 5일 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장날에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했다. 장보러 나온 김에 머리를 깎기로 작정한 손님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기 때문에 오전 4시에 문을 열고 흐린 알전구 불빛 아래에서 밤 10시까지 머리를 만져야 했던 것이다. 일손이 모자라 이발사 서너 명을 고용해도 밀려드는 손님에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 10여년 동안 이어졌다.
그래도 대목은 명절 밑이었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명절 밑에 대중목욕탕과 이발소는 그야말로 ‘만원사례’를 붙여야 할 정도였다. 지금도 명절을 앞두고 목욕탕과 이발소가 붐비는 것은 여전하지만 ‘묵은 때를 씻는다’며 명절을 기화로 심신의 피로를 털어버리려는 그저 통과의례로 남아있을뿐 연례행사로 용모단장을 하던 옛날의 상황과는 본질부터 다르다.
박씨는 “명절 밑에는 밤을 새서 머리를 깎고 동이 틀 때야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는데 하얀 위생복에 코피가 떨어질 때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
| ▲ 1964년에 딴 이용사 면허증과 오래된 이발기구들 | ||
육거리시장 친구이발관이 개업 36년을 맞고 있지만 박씨의 이발인생은 반세기를 바라본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천형(天刑)과도 같이 느껴졌던 농군의 삶을 피해보고자 17살부터 이발기술을 배운 것이 평생의 업이 됐기 때문이다.
이발기술을 배우기 위해 당시 청주시내에서 잘 나간다는 이발소 여러 군데를 전전했는데, 지금까지 이름이 기억나는 곳은 옛 중앙극장 인근에 있던 명진이발관이 유일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위를 잡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6.25전쟁 직후 수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터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부터 시작해 바닥을 쓰는 일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발소 안에 제대로 발을 들였다. 다음으로 머리를 감겼고 면도를 손에 익힌 뒤에야 이발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박씨가 자기 앞으로 개업한 첫 이발소는 지금의 방서동, 즉 대머리에 차린 시골이발관이었다. 지금이야 큰 도로가 났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먼지가 폴폴 날리는 황톳길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1년만에 대머리라는 지명과 이발소라는 명칭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머리 이발소’의 문을 닫고 1971년 육거리시장으로 진출한다. 지금의 친구이발관 인근에서 개업한 뒤 앉은뱅이처럼 옆집, 옆집으로 자리를 옮겨 세 번째 가게인 지금의 자리에서 17년을 맞고 있다.
 | ||
| ▲ 50대 이상의 손님이 많다보니 염색할 일도 잦다. | ||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발관 주변도 깔끔하게 정비가 됐다. GMC 트럭이나 신진 6톤으로 이 장 저 장 장짐을 옮겨주던 건영화물도 시내 외곽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른바 실비집으로 불리던 왕대포집도 지금은 자리를 감췄다. 밤이면 울려퍼지던 작부들의 젓가락 장단과 구성진 노래자락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다만 빛바랜 흑백사진과도 같은 ‘오래 전 그날’의 편린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친구이발관에 모여 굽이굽이 에돌아 흘러온 삶의 곡절을 나누고 또 어루만지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