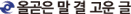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얼치기 여행가의 실상사(實相寺)탐방기 2-
새벽 4시 예불을 드린 후, 실상사 앞 들녘으로 나왔다. 천 년 전 사부대중이 함께 일구었다는 들판이다. 모를 일이다. 알곡들로 꽉 차가는 늦여름 새벽 들녘에서 왜 겨울 해질녘이 생각나는 걸까. 간밤, 고요하던 절집 마당에 길고도 깡마르게 누워있던 실상사 삼층석탑의 그림자 때문이었을까.
그동안 역사유적지를 갈 때마다 물었던 질문들이 있었다. 역사상 죽어서 없어져간 것은 무엇이며, 없어졌으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에서의 손짓은 먼 옛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짚어봐야 하는 것인데, 나의 역사에서는 지금 무엇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 무엇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인가.
빛이 사위어 어둠으로 가득 찼던 들판에 다시 빛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논길 옆 쑥부쟁이도 보랏빛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제 저녁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다. 종무소 사무원의 딸아이다. 서울내기 같이 새침한 아이에게 쑥부쟁이꽃 전설을 이야기 해주며 말을 걸었더니, 눈을 반짝이고 침을 꿀꺽 삼키며 뒷이야기를 궁금해 했다. 그동안 내가 만났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몸으로 물기가 젖어든다. 들길 풀섶이 바짓가랑이를 적시고, 쑥부쟁이에 맺힌 아침이슬 같았던 아이들이 눈가를 축축하게 한다. 얼룩얼룩해진 눈에 6시 아침 공양 시간을 맞추러 가는 옆방 템플스테이 가족들과 절 식구들의 모습이 보인다. 같이 따라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공양간 반대편 실상사 작은학교 쪽으로 간다. 절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다.
천 년 전, 실상사는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후, 소멸과 소생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인드라망 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이다. 그래서 생명학교, 한생명 공동체, 귀농학교, 작은학교 등 산하기관을 여럿 두고 있다. 인드라망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이루는 그물눈에 하나하나의 모든 구슬들이 서로의 아름다운 소질을 이중삼중으로 서로 비추고 있고, 또 그 별개의 구슬들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실상사 작은 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몇 채의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 교사(校舍)로 쓰고 있고, 운동장도 아주 작았다. 그 흔한 축구 골대도 없고, 달리기 트랙은 더더욱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나 교사 옆 자전거 거치대를 보니 이 너른 들판이 곧 학생들이 누비는 공간이요, 가지런히 꽂아둔 호미며 농기구들이 살아있는 배움터임을 보여준다. 컨테이너 교사 바깥벽에는 아이들의 꿈이 담긴 낙서가 가득하고, 교실 안에는 열 개가 채 넘을까 말까한 책상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다. 운동장 옆 생태 뒷간도 요즘 아이들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해가 중천으로 뜨자 허기가 밀려온다. 아이들의 생기가 허기를 불러온 건지도 모르겠다. 공양간으로 간다. 아침 공양 시간은 벌써 끝나고 벌써 점심 공양과 제사 준비가 한창이다. 슬쩍 무릎을 들이밀며 일손을 거든다. 젊은 보살에게 친정어머니 연배의 공양주 보살의 연세를 여쭤보았다. 나보다 24살 차이의 띠 동갑이시다. 얼핏 무뚝뚝해 보이는 공양주 보살께 그렇게 말꼬를 터나갔고, 결국 때늦은 아침을 챙겨 먹는 것으로 내 몸 공양을 했다.
그렇다. 나는 사람을 잘 사귄다. 특히 어린 아이와 어르신들, 그리고 ‘아줌마’로 통칭되는 동성의 친구들에게서 공감대를 잘 만들었다. 그게 생기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이었고, 나의 실체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사람들 역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뜻이 사방에서 막히고 있었다. 사람들과 막힌다는 건 곧 우주와 막히는 거였다. 우주와 막히는 공간에는 생기가 깃들지 않는다.
실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찾아왔던 실상(實相寺)사에서 나는 또 하나 뜻하지 않은 구경거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공양간으로 웬 처사가 들어와서다. 생명평화결사 탁발순례단의 운전봉사자라고 한다. 하반기 순례를 막 떠나려고 하는 참이라며 공양주 보살께 인사를 한다. 구경거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밝히는 터라서, 얼른 손을 털고 따라 나섰다.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모두 한 몸임을 실천하는 발걸음을 좀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도법 스님을 비롯한 생명평화결사 탁발순례단은 실상사 윗쪽 화엄학림에 모여 있었다. 생각보다 인원도 적고 분위기도 조용하기만하다. 돌아가면서 차를 마시며 잔잔한 일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일행까지도 충분히 차를 마실 만큼 천천히 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얻어먹는 탁발인지라 순례단의 덩치를 일곱 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더니, 절집 식구들의 배웅도 마찬가지다. 그저 각자 자기들 있는 자리에서 가만가만 ‘오늘 떠나신대.’‘언제 돌아오시지?’ 정도의 말만 주고받을 뿐이다.
탁발순례단 승합차가 떠난 자리에 나 혼자 오롯이 남았다. 산 아래 실상사까지는 꽤 걸어야 한다. 실상사는 통일신라 말 선종(禪宗)이 신라 불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해 세운 구산선문(九山禪門)중에서 최초의 절이다. 왕실귀족과 교종의 기득권 세력에 이심전심과 체험을 중시하는 선종으로 맞서기 위해서였다. 나말여초, 그 격동기에 이 땅에 새로운 사상적 대안을 내놓았듯, 지금의 실상사도 이 땅에 ‘생명과 평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더구나 내가 서있는 이곳 화엄학림은 94년도 조계종 사태 이후 종단 교육 개혁 차원에서 연 스님들의 공부방이다. 한마디로 진흙탕 같은 위기에서 다시 근원을 물으며 스스로의 개혁을 결사했던 곳이다.
걷기가 힘들다. 저 아래 실상사가 흔들려 보인다. 연꽃방죽 둑에 쪼그리고 앉는다. 잠자리들이 연꽃봉오리 끝만 골라 앉고 있다. 우리들 삶에도 장대 끝 같은 위기가 있다. 그러나 장대 끝은 어찌 보면 하늘과 맞닿은 시작이다. 바랑 속 불안을 모두 꺼내어 연이파리에다 또르르 굴려버린다. 어두운 불안이 빛나는 구슬로 변하고 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외롭고 지친 발걸음 멈추고 바라보는
빈 벌판
빨리 지는 겨울 저녁 해거름 속에
말없이 서있는
흠없는 혼
하나
당분간 폐업합니다 이 들끓는 영혼을
잎사귀를 떼어 버릴 때
마음도 떼어 버리고
문패도 내렸습니다
그림자
하나
길게 끄을고
깡마른 체구로 서 있습니다
- 겨울나무/ 장석주-
 | ||
| ▲ 신라말, 고려초의 격동기에 이 땅에 새로운 사상적 대안을 내놓았듯 지금의 실상사도 구산선문의 최초 가람으로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촘촘히 인드라망을 넓히고 있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귀농전문학교, 실상농장, 지리산생명평화연대, 대안학교인 작은학교 등이 생명평화운동 실천적 현장이다. | ||
빛이 사위어 어둠으로 가득 찼던 들판에 다시 빛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논길 옆 쑥부쟁이도 보랏빛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제 저녁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다. 종무소 사무원의 딸아이다. 서울내기 같이 새침한 아이에게 쑥부쟁이꽃 전설을 이야기 해주며 말을 걸었더니, 눈을 반짝이고 침을 꿀꺽 삼키며 뒷이야기를 궁금해 했다. 그동안 내가 만났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몸으로 물기가 젖어든다. 들길 풀섶이 바짓가랑이를 적시고, 쑥부쟁이에 맺힌 아침이슬 같았던 아이들이 눈가를 축축하게 한다. 얼룩얼룩해진 눈에 6시 아침 공양 시간을 맞추러 가는 옆방 템플스테이 가족들과 절 식구들의 모습이 보인다. 같이 따라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공양간 반대편 실상사 작은학교 쪽으로 간다. 절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다.
천 년 전, 실상사는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후, 소멸과 소생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인드라망 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이다. 그래서 생명학교, 한생명 공동체, 귀농학교, 작은학교 등 산하기관을 여럿 두고 있다. 인드라망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이루는 그물눈에 하나하나의 모든 구슬들이 서로의 아름다운 소질을 이중삼중으로 서로 비추고 있고, 또 그 별개의 구슬들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 ||
해가 중천으로 뜨자 허기가 밀려온다. 아이들의 생기가 허기를 불러온 건지도 모르겠다. 공양간으로 간다. 아침 공양 시간은 벌써 끝나고 벌써 점심 공양과 제사 준비가 한창이다. 슬쩍 무릎을 들이밀며 일손을 거든다. 젊은 보살에게 친정어머니 연배의 공양주 보살의 연세를 여쭤보았다. 나보다 24살 차이의 띠 동갑이시다. 얼핏 무뚝뚝해 보이는 공양주 보살께 그렇게 말꼬를 터나갔고, 결국 때늦은 아침을 챙겨 먹는 것으로 내 몸 공양을 했다.
그렇다. 나는 사람을 잘 사귄다. 특히 어린 아이와 어르신들, 그리고 ‘아줌마’로 통칭되는 동성의 친구들에게서 공감대를 잘 만들었다. 그게 생기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이었고, 나의 실체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사람들 역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뜻이 사방에서 막히고 있었다. 사람들과 막힌다는 건 곧 우주와 막히는 거였다. 우주와 막히는 공간에는 생기가 깃들지 않는다.
실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찾아왔던 실상(實相寺)사에서 나는 또 하나 뜻하지 않은 구경거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공양간으로 웬 처사가 들어와서다. 생명평화결사 탁발순례단의 운전봉사자라고 한다. 하반기 순례를 막 떠나려고 하는 참이라며 공양주 보살께 인사를 한다. 구경거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밝히는 터라서, 얼른 손을 털고 따라 나섰다.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모두 한 몸임을 실천하는 발걸음을 좀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도법 스님을 비롯한 생명평화결사 탁발순례단은 실상사 윗쪽 화엄학림에 모여 있었다. 생각보다 인원도 적고 분위기도 조용하기만하다. 돌아가면서 차를 마시며 잔잔한 일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일행까지도 충분히 차를 마실 만큼 천천히 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얻어먹는 탁발인지라 순례단의 덩치를 일곱 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더니, 절집 식구들의 배웅도 마찬가지다. 그저 각자 자기들 있는 자리에서 가만가만 ‘오늘 떠나신대.’‘언제 돌아오시지?’ 정도의 말만 주고받을 뿐이다.
 | ||
| ▲ 생명평화 탁발 순례를 떠나기 직전, 차 한잔씩 나누며,사진 오른쪽이 순레단장인 도법스님. | ||
 | ||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외롭고 지친 발걸음 멈추고 바라보는
빈 벌판
빨리 지는 겨울 저녁 해거름 속에
말없이 서있는
흠없는 혼
하나
당분간 폐업합니다 이 들끓는 영혼을
잎사귀를 떼어 버릴 때
마음도 떼어 버리고
문패도 내렸습니다
그림자
하나
길게 끄을고
깡마른 체구로 서 있습니다
- 겨울나무/ 장석주-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