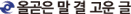1443년,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실록 기록(12.30)에서 훈민정음이 음표와 같은 문자임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 “字雖簡要, 轉換無窮(자수간요 전환무궁)”이란 표현이다.
지금 말로 풀어보면 ‘글자는 비록 28자(기본자)로 간결하지만,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전환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뜻이다. 또한 그런 글자로 그 어떤 말소리라도 그대로 적고 우리의 생각, 느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간결한 자음자와 모음자의 조합으로 끝없이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는 마치 기본 음표의 결합으로 거의 무한대의 곡을 만들어 수많은 노래와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음표같은 문자,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음표와 같은 문자로 가능한 것은 훈민정음이 절대 음가를 갖는 음표와 같은 일자일음주의를 지향하고, 자음자에는 실제 음악 속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훈민정음은 음악 원리가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음악의 음표와 같은 문자이기도 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훈민정음에 적용된 음악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15세기 동양의 보편적 음계였던 궁상각치우의 기본 음계 적용이다. 제자해에서 “무릇 사람의 말소리는 오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계절에 합하여도 어그러짐이 없으며, 오음계와 맞추어 봐도 잘 어울리고 틀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뒤,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는 물이다. 말소리가 비어 있는 듯이 통하므로 이는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음률로는 ‘우음계’이다.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이다. 어금닛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목이 꽉 차므로 나무가 물에서 나되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고, 음률로는 ‘각음계’이다.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니 오행으로는 불이다. 혓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은 불이 타올라 퍼지며 위아래로 오르내림과 같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음률로는 ‘치음계’이다. 이는 억세고 끊을 듯 날카로우니 오행으로는 쇠이다. 잇소리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걸리는 듯하게 나는 것은 쇠가 부스러졌다가 다시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음률로는 ‘상음계’이다. 입술은 모난 것이 나란히 합해지니, 오행으로는 땅이다. 입술소리가 머금으며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머금으니 넓고 큰 것과 같다.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음률로는 ‘궁음계’이다.
_≪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번역: 김슬옹(2023).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 박이정. 293쪽.
말소리가 나오는 원리에 따라 음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날숨과 들숨이 이루어지는 허파에서 말소기가 나오는 순서에 따라 ‘목구멍소리→어금닛소리→혓소리→잇소리→입술소리’ 순으로 적용하니 음계순은 ‘우음→각음→치음→상음→궁음’이 된다. 곧 목구멍소리가 우음계이고, 어금닛소리가 각음계이고, 혓소리가 치음계, 잇소리가 상음계, 입술소리가 궁음계이다. 음계 순으로 보면 ‘궁음(입술소리)→상음(잇소리)→각음(어금닛소리)→치음(혓소리)→우음(목구멍소리)’가 된다. 곧 평균적으로 보면 입술소리가 가장 낮음 음계와 같은 소리로 작용하고 후음이 가장 높은 음계로 작용한다.

이를 동양의 오행 철학에 따른 단순 적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는 첫 번째 증거는 중국의 대다수 성운학 책에서는 입술소리와 목구멍소리 음계가 ≪훈민정음≫ 해례본과 정반대다. 곧 중국 수나라 육법언(陸法言)의 ‘광운 삼십육자모지도(三十六字母之圖)’와 명나라 태조 때의 ‘홍무정운 삼십일자모지도(三十一字母之圖)’에 나타난 성음(聲音)의 분류는 음의 발성 위치에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의 일곱 가지를 나누었는데 후음을 우리와 달리 궁음계로, 순음을 우음계로 보았다.
세종 이도(李裪)는 사대주의가 절대적인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런 중국 성운학의 일반적 분류를 무시하고 궁음과 후음의 위치를 바꾼 것은 실제 말소리 현상을 분석하고서였다. 관념적인 오행 철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음계를 고려하여 오행과 연계한 것이다. 이를 현대 물리학적 실험과 분석으로 훈민정음에 적용된 ‘궁상각치우’가 실제 음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한태동(2003)의 ≪세종대의 음성학≫(연세대출판부)에서였다.
음악 원리를 훈민정음에 적용한 자신감을 ≪훈민정음≫ 해례본의 꼬리말(에필로그) 격인 정인지서에서는 ‘훈민정음은 말소리에 따라 만들어 그 소리는 음률의 일곱 가락에도 들어맞는다’라고 했다. 음률은 천지자연의 소리에 담긴, 자연적 보편 현상이자 원리이기도 하므로 “하늘·땅·사람의 세 바탕 뜻과 음양 기운의 신묘함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스물여덟 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글자 소리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음악 노래로는 노랫가락을 어울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쓸 때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비록 바람소리, 두루미 울음소리, 닭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절대 음감의 대천재
세종만이 가능한 창제
세종이 음표와 같은 문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음악적 천재성과 바른 음악을 바른 정치를 하고자 했던 치열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훈민정음 창제(1443) 10년 전인 1433년 새해 첫날인 설날, 궁궐은 새해맞이로 분주했다. 근정전에서는 일본과 여진 축하 사신까지 와서 더욱 분주했다. 새해맞이 회례연(會禮宴) 연주까지 열렸다. 세종 이도는 연주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편경은 과연 부드럽지도 어울리지도 않고, 지금의 우리가 만든 편경이 옳게 된 듯하오. 이는 우리 땅에서 맑은소리돌[경석(磬石)]을 얻어 큰 다행으로, 지금 소리를 들으니 또한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율(律)을 만들어 음(音)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다만 아랫줄 첫 번째 돌[이칙(夷則) 1매(枚)]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이오.
_≪세종실록≫ 세종 15년(1443) 1월 1일
이때 편경 개발 주역이자 음악 총감독이었던 박연[朴堧, 1378-1458]이 깜짝 놀라 살펴보고,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 있으니 다 갈지[磨] 아니한 것입니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편경 아랫줄 첫 번째 돌에 먹물이 살짝 묻어 있어 미세한 음의 차이가 난 것을 세종이 멀찍이서 듣고 발견한 것이다.
흔히 이 사건을 절대음감 세종의 청음 사건이라고 한다. 세종은 실제로 절대 음감이었고 작곡가였으며 음악 대천재였다. 이를 훈민정음 창제 배경과 동기 차원에서 보면, 훈민정음은 말소리의 과학적 분석으로 그 원리를 그대로 문자도형으로 만든 문자이니 말소리 연구가 절대적인데 세종의 음악 연구가 말소리 연구로 이어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종은 이미 이 사건 8년 전인 1425년부터 중국에서 수입해온 악기로 연주하는 것의 문제를 인지하고 역시 음악 대천재인 박연을 만나 이를 바로잡는 연구와 악기 개량 작업을 해온 것이었다. 세종 31년(1449년) 12월 11일 자 세종실록에는 이와 관련 기록이 나온다. 세종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새로 정비한 신악(新樂)이 비록 제례 음악인 아악(雅樂)에 쓰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대 임금님의 공덕을 표현하고 있으니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의정부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함께 이를 관찰하여 보완할 것을 말하면, 내가 마땅히 다시 다듬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사관은 논평하기를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신악(新樂)의 작곡은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의 기준을 삼아 하룻저녁에 제정하였다. 수양 대군 이유(李瑈) 역시 노래와 음악에 정통하였으므로,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니, 기생 수십 인을 데리고 가끔 궁궐에서 이를 익혔다. 그 춤은 칠덕무(七德舞)를 모방한 것으로, 궁시(弓矢)와 창검(槍劍)으로 치고 찌르는 형상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1433년의 청음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박연은 세종의 소리와 음악 연구의 동반자이자 절대적인 공로자였다. 세종이 아무리 음악의 천재라 하더라도 박연의 도움 없이는 표준음과 표준 악기(편경) 제정을 제대로 못하거나 오래 걸렸을 것이다. 소리 연구가 훈민정음 창제의 실질적인 바탕이라면 박연은 훈민정음 창제 공로자인 셈이다. 음악적 특성에 기반한 훈민정음은 진정한 소리문자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실용적인 문자가 되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