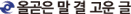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 ||
1998년 IMF 금융위기로 나라가 실의에 빠졌을 때, 웅덩이(해저드)에 들어가 공을 쳐올린 박세리 선수의 하얀발은 그야말로 각본없는 드라마였다. 이 장면은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는 양희은의 노래와 함께 공익광고로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골프장을 드나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축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김영삼 정부 시절 공무원들에게 골프장 금족령을 내린 적도 있지만 이미 골프는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귀족스포츠라는 이미지를 상당 부분 벗어던진 지 오래다.
도내에서도 지방 공무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골프를 즐기는 것은 이제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무관 이상만 돼도 ‘쉬쉬’하면서 골프를 치지 않는다. 한담의 소재로 골프가 등장하는 경우도 잦다. 더 이상 누가됐든 취미생활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이유도 명분도 없게 됐다는 얘기다.
다만 골프장에서 골프만 치지 않고 무언가 모사를 하고 검은 거래가 오가다보면 뒷탈이 나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풀코스 술접대로 로비를 했지만 요즘엔 골프접대가 더 인기가 있다는데, 2005년 대전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충북 출신 고교 3인방이 건설업체로부터 해외원정 골프접대를 받으며 수억원을 수뢰한 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사실 요즘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일정한 지위, 재력을 갖춘 사람들의 골프비화가 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정치인들이 ‘삼일절 골프’나 ‘수해 골프’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보면 사실 ‘큰 부정과 연루된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에게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인이므로 감수해야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잣대는 더 엄격해질 것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영동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군비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구복 군수가 이와 관련해 기업 유치와 예산 확보, 군민 화합을 위해 12차례 골프를 쳤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의혹은 더 커져가고 있다.
정 군수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들이 대부분 골프 로비 이전에 결정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 군의회 의장 역시 10차례 골프를 쳤으나 이 내역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떳떳하다면 낱낱이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를 위해 구입한 회원권이라면, 아니 공무를 위해 정말로 회원권이 필요하다면 군수나 의장이 아닌 공무원도 공무를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골프채를 잡으면 업자들이 괴롭다’는 말이 있다. 자칫하면 주민들까지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공인의 처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