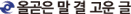가을의 초입 싸리꽃이 절정을 이룬 산기슭은 보랏빛으로 출렁입니다. 사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부르르 떨고 있는 여인처럼.
 | ||
싸리꽃은 화려하지 않고, 귀족적이지 않아서 더 마음이 가는 꽃입니다. 한아름 안고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땅한 꽃병이 없어도 무색해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편안하고 소박한 꽃입니다.
계집아이들처럼 자잘한 웃음을 지닌 정겨운 나무, 정겨운 꽃입니다. 이토록 많은 꽃잎들을 어디에 숨겨 두었던 것일까? 느지막이 피운 꽃은 건들대는 바람과 비비적거리는 곤충의 몸짓을빌어 짝을 찾고, 서둘러 열매를 만듭니다. 장대비를 꿋꿋이 이겨낸 가지 끝, 꾹 참았던 웃음 한꺼번에 토해놓 듯 싸리꽃은 그렇게 피고 집니다.
쓰임새나 꽃, 잎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사립문으로 생활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잎에는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아스코르빈산이 많고, 껍질에는 탄닌이 들어 있으며, 껍질과 줄기 잎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에 구황식물로도 쓰였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깃들어 있는 나무입니다.
줄기에 기름이 많아 불에 잘 타고, 불심이 좋고 연기가 없이 오래 타는 까닭에 군사작전에 많이 쓰였던 나무로 대하소설 ‘태백산맥’에는 싸리나무로 불을 지피는 이야기가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찰에는 대웅전의 기둥을 비롯하여 구시(구유)와 목불(木佛)에 이르기까지 큰 나무 유물이 싸리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진 교수의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싸리나무가 아니라 느티나무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느티나무의 재질이 사리함 등 불구(佛具)의 재료로 매우 적합하여 절에서도 흔히 사용한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사리함을 만드는데 쓰였든 느티나무를 처음에 사리(舍利)나무로 부르다가 발음이 비슷한 싸리나무가 되었을 것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식물은 종마다 개체마다 다른 잎, 다른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이들은 생존 경쟁의 논리보다 상생의 논리가 더 또렷이 나타납니다. 베푸는 질서, 삶의 기본이란 것도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한알의 과일로 익고 싶은 계절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천, 찬반 공방으로 어수선 한 이 때, 상생의 중심 흐름을 되짚어 봄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