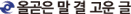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기자생활이 좋은 경험됐다”
문학도에서 기자, 그러다가 야인... 다시 작가. 어느날 우리 주변에서 홀연히 사라졌던 이항복씨가 이번엔 소설가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1년간 마치 무슨 ‘부름’에 홀린 듯 시공을 넘나들며 써 내렸다는 장편 ‘사랑의 조건’은 이미 서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천명을 바라 보는 늦은 나이의 첫 장편이라 그는 출판에 넘기고서도 모골이 송연한(?) 설레임을 느꼈다고 한다. 그 작품이 지금 서점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보내라’는 성화를 받고 있으니 일단은 성공이다.
이항복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문사 기자로서 그를 되새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실력이 검증된 작가였다. 건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87년 충청일보 신춘문예에 <배냇소>라는 단편소설로 당선됐고, 94년엔 계간 <문단>의 제 1회 신인상 소설부문에 올라 문단에 이름 석자를 알렸다. 충청매일 편집부국장으로 세상 일에 흠뻑 빠져 있던 그는 한참동안 시간을 죽이는 공전(空轉)의 궤적을 잇는 듯 하더니 잡자기 짐을 정리, 청원 초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첫 장편 ‘사랑의 조건’이다. 그래서 그런지 소설을 읽다보면 청주 인근의 익숙한 지명과 명소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이런 선문답을 내렸다. “모름지기 소설가는 눈빛이 깊어야 한다. 예컨대 소설가라면 바다와 같아야 한다.... 이 세상에 가치없는 탄생이 없듯, 이 소설 역시 어떠한 의미로든 일말의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기자생활이 사회현상을 성찰하는 작가의 눈빛을 깊게 했고, 사물인식에 대한 바다와 같은 심성을 안겼다고 강변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기자로서 현장을 누빈 경험이 작품구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순수 예술을 지키려는 한 화가의 고독한 영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반추하고 고발한 이 소설은 우선 ‘장편은 곧 부담‘이라는 통념을 깼다. 문학과 예술이 그들만의 ‘유희’여서는 안 된다는 평소 작품관의 발로다. 때문에 그가 솔직하게 “현실과 타협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알겠다. 간간이 등장하는 세속의 자지러지는 사랑놀음이 이 소설을 단숨에 읽게 하기 때문이다. 이항복씨는 전업작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