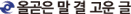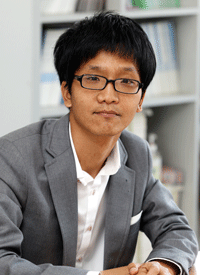
왜일까. 학교폭력이 근절돼서일까. 아니다.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을 뿐이다. 새 학기는 시작됐고 지금 어디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10년 , 20년 그 전에도 있어왔던 일이다.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군대 내에서 욕설과 구타 등의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듯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렇듯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 학생, 혹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를 책망할 수 없다.
그렇다고 두 손 들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릴 수는 없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 경찰이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재방방지와 예방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도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생각을 달리해볼 때가 됐다.
학교폭력은 빗나간 학생, 학교의 관심부족 등 개별요소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는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경쟁적 교육구조 속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권장되고 있는 것 아닌지 되짚어봤으면 한다. 학생이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끔찍하다.
지난 1월 초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성폭행과 금품갈취 등을 일삼은 속칭 ‘일진회’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학생 4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 된 큰 사건이었다.
그 보도를 보고 기자는 10여 년 전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해당 학교는 기자의 모교였기 때문이다.
입학 당시 반 학생들의 체구 차이는 두드러졌다. 그들에게서는 월등한 힘의 차이가 났다. 각 초등학교에서 온 ‘짱’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했다. 싸움이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흉기 또는 둔기가 됐다. 소화기, 급식용 국자, 숟가락, 젓가락 등이 대표적이다.
시간은 흘렀고 암묵적인 서열이 정해졌다. 그 서열에 끼지 못한 약한 학생들은 힘 쎈 아이들의 샌드백이 됐다.
그 속에서 하나의 판단을 내렸다. 내 힘이 약해서 맞지 않으려면 힘 쎈 친구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타협해 갔다. 대개는 숙제를 대신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1년을 살았고 맞거나 금품을 갈취당한 적은 없다.
그 기억은 참 부끄럽다. 맞은 것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내게 남기고 말았다. 지난 달 증평초등학교의 한 교실을 취재를 갔을 때다. ‘폭력의 동그라미’라는 이름의 역할놀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구조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이 내게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어자, 동조자, 조력자, 방관자, 소극적 조력자, 소극적 방어자로 나뉘는 고리를 보며 기자는 10년 전 내가 방관자가 아닌가 생각해 봤다. 소극적 조력자 일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부끄러움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찾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