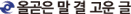글_ 間竹金佯
간(깐)죽되는 김양이라는 뜻인데 혹시 대나무사이에서 나는 거짓쇳소리라는 중의적으로 해석가능
이 코너에서 영화는 다양한 평론방식으로 전개되며 3가지로 구분코자 합니다.
①우와(꼭 보세요라는 의미)②그저 그런(시간되시면 보시라는 뜻) ③그것도 영화냐(절대 보지 마세요)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감정이 내재되는 평이기에 적확하다고는 장담 못합니다.(필자 드림)

감독 박찬욱, 박찬경
출연 이정현, 오광록, 이용녀, 김환희
박찬욱 감독과 동생 박찬경이 공동으로 연출한 아이폰 영화 <파란만장>은 조명이나 음향 등은 일반 영화와 같은 시스템과 스텝이 참가하되 카메라만 35밀리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폰 영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2시간 남짓한 일반영화의 1/4정도의 러닝타임인 35분 내외의 상영시간, 간단한 스토리, 소수의 시퀀스는 청소년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여 개봉한지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다. 즉 학교 폭력, 흡연, 학생 인권, 性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안 보내는 유일한 시즌인 5월이기에 이 영화를 살펴보게 된 이유이다. (어린이, 어버이, 스승에는 문화폭력이 내재되어있다.)
2. 이야기
영화 <파란만장>의 스토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늦은 밤 물가에서 혼자서 낚시를 즐기던 중년 남성(오광록)이 소복을 한 채 기절한 여인(이정현)을 물고기 대신 낚게 된다. 그 여인은 의식을 찾고 잠시 후에 ‘아빠’를 찾으며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황해도식 굿이 펼쳐진다. 주연 오광록은 최근 악재를 딛고 재기해 부모 은혜를 소재로 한 신인가수 소리소의 뮤직비디오<영웅>에 출연하기도 했다. 오광록의 무심한 슬픔표정이 압권이다.
3. 굿
실제 굿판 혹은 굿을 다룬 영상물들에서 사람들은 별다른 느낌 혹은 감동은 물론 더더욱 감정이입을 받거나 하지 않는 것 같다. 고대인들이 동굴벽에 그린 들소그림 類 혹은 뚱뚱한 비너스 조각 등은 바람과 갈구가 있는 주술적인 이미지라고 미학자 김융희는 말한다. 대개의 경우 근대화 이후 이런 類의 일들은 이벤트화 되거나 혹은 주술적 의미들이 왜곡되고 변질 즉 신성성을 지닌 사물들과 이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 중개변인이 작동하여 전근대, 미신, 촌스러움으로 해석되어진다.
사실 죽음이란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도 체험하거나 알 수 없는 영역임에도 假死, 빙의, 구명의식 등등의 형태로 죽음 콘텐츠가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하나의 장면, 대개 이승의 연장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여부는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무당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고 맺힌 한을 풀어주고 살아남은 자들이 故人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안식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는 믿음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 영화<파란만장>은 이정현의 너무도 천연덕스러워서 소름이 간혹 돋는 연기 ? 물에 빠진 후 일어나는 장면은 물론 너무도 타령을 잘해서 실제 무당으로 보인다.
이미 1996년, <꽃잎>에서 全裸의 연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지금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발가벗음은 진부한, 식상한 표현의 방식이지만(요즘의 인터넷은 사생활 폭로로 사람들을 벗기지만)당시에만 해도 파격이었다. 신기어린 이정현을 위한 영화가 <파란만장>인 듯.
4. 폰 영화 지역에서의 가능성
무당, 도깨비 등등 지역에 산재한 신화, 설화는 이른바 스토리텔링으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원이다. 여기의 주요변수인 창의성은 기성세대의 엄숙, 구호, 편견과 고정관념들로서는 절대로 발현되지 않음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어느 지역이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아집과 굳어버리거나 연마안하는 실력 혹은 감각이 문제다. 이러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전통과 관습 그리고 ‘다 똑같아’의 논리로 死藏시킨다. 이러한 답답함을 벗어나려면 새로움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사실 다 시행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느냐가 핵심.
최근 베니스 영화제에 아티스트 필름 섹션이 개설되고 장르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실험들이 피터 그리너웨이, 데이비드 린치, 차이밍량, 하룬 파로키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영화, 전시, 설치, 사진, 회화의 선을 넘나드는 것으로 미디어 아트활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일신여고에 다니던 정모양이 스승의 날 UCC로 만든 ‘제자의 유혹’은 전국 조회수가 20만건을 넘었지만 그 후 이 친구, 영문학을 공부한답시고 두문불출인 듯하다.
이러한 친구들을 영상의 세계로 진입시키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고 못 본 척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일반적 관행이지만 최소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아니 지금의 우리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혹은 파란만장적인 삶을 살라고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다면 베네주엘라의 ‘엘시스테마’와 같은 제도를 고민할 때인 듯하다. 또는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작은 금액을 할당해서 청소년공예영상제를 하는 것도 좋을듯하다.
예술로서의 공예를 지향한다면 안 될 얘기지만 공예인들의 삶과 철학을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스마트폰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기획안을 심사한 후 투융자 하는 방안은 어떨까? 역시 탁상공론이라 한심하다는 생각. 영화 <파란만장>은 한번쯤 볼만하지만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