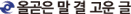얼치기 여행가의 속리산 산행기 2.
“......살림 하나 없던 암자가 큰 집으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 바랄 테니, 뼛속 깊은 아픔 속에서도 다시 걸어 나갈 용기만 주소서.” 지난 번 탈골암(脫骨庵)을 나오며 했던 그 기도가 효험을 본 것일까. 이번 여행은 용기를 길동무 삼아 가는 길이다.
행선지는 다시 속리산, 그중에서도 문장대. 솔직히 말해 초행길이다. 피치 못할 일거리 때문에 두어 번 천왕봉은 올라봤지만 번번이 무겁게 다녀왔던 발걸음이었다. 내려오는 즉시 글을 써야 했던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체질적으로 높은 산을 좋아하지 않는 다는 게 더 큰 이유였다. 땀이 나거나 숨이 차는 걸 몹시도 싫어하는 것도 병이라면 병일까.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지난 주 탈골암을 다녀온 이후로 다시 속리산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계를 밟고 싶었다. 속리산은 내게 있어 줄곧 부담스런 대상이었다. 국보급 문화재가 우르르 모여 있는 법주사는 공부거리로서 무거운 곳이요, 잘 생긴 속리산 줄기 역시 생각만 해도 사뭇 나를 가위눌리게 했다.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게으름일 수도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용기 부족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인식을 하고난 다음에 할 일은 행동밖에 없다. 한계를 뛰어 넘고자 내미는 발걸음이라선지 몸이 가볍다. 하늘은 장마철 초입답게 잔뜩 찌푸리고 있는데 바람은 퍽 상냥하다. 대문간을 나서는 등 뒤에서 볼멘소리가 날아온다.
“이런 장마시기에 산엘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남편의 목소리다. 아마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주말인데 집에 좀 있지 않고.’일 것이다. 여느 때 같으면 떠나는 발걸음이 꽤나 불편했을 것이다. 가슴 한 자락이 묵직해지거나 살갗이 오소소 일어날 정도로.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 생애 처음으로 높은 산을 혼자서 올라보겠다는 날! 뜨거운 대지를 한결 누그러뜨리는 바람처럼 상냥해지기로 한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쯤 아마 나는 퍽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외다.’ 입안에 괴는 말도 단물처럼 달게 삼켜 버린다. 때로는 가장 가깝고 든든한 울타리가 외려 가장 높은 벽이 된다. 거창고등학교 교훈에도 있다지 않은가. “부모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름날 시원한 바람은 대개 비와 함께 온다. 햇살이 보이지 않는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에 들어가는 길에서 비를 만나지 말았으면 싶었다. 몸 하나야 비 오시는 대로 맞아주면 그뿐이지만, 사진 찍는 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는 나보다 먼저 속리산을 찾아와 있었다. 법주사 일주문까지는 괜찮더니 세심정 휴게소는 이미 비에 푹 젖어 있다. 감자전 지지는 냄새가 더욱 고소하게 흘러나온다.
혼자 걷는 길은 느리다. 세심정 휴게소에서 복천암을 지나 보현재까지 가는 30분 길도 느릿느릿하다. 보현재는 할딱고개라고도 불린다. 숨을 할딱할딱 쉬게 할 정도로 가파른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개 입구에 할딱재라는 팻말도 붙어 있다. 그런데 의외였다. 그다지 힘겹다는 느낌 없이 수월하게 올라온 듯하다. 비와 함께 시원하게 걸어와서 그런가. 한여름 짙푸른 숲 속에서 말갛게 피어나는 새하얀 함박꽃나무를 보며 천천히 올라와서 그런가. 별로 할딱이지 않았다.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문장대가 있다는데 멀게만 느껴지지도 않는다.
보현재 휴게소 평상에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무는데 뒤 이어 올라온 한 무리 등산객들이 아이스크림 값을 가지고 점방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하나씩 입에 물고 다시 산으로 들어간다. 그 뒷꼭지에 대고 청년과 그 어머니가 세상인심을 탄식한다. 지고 올라오는 수공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쯧쯧. 예전에는 속세를 떠난 사람들답게 술 인심, 아이스크림 인심이 꽤 후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쯧쯧.
그러고 보니 산길도 많이 메말라졌다. 예전에는 산을 오를 때, 내려오는 이들의 ‘수고하신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말 인심에서 발 힘이 다시 솟곤 했었는데, 이젠 손에 든 지도와 무표정한 이정표가 덕담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와 함께 생전 처음 보는 이들과 스쳐가며 씩 웃던 웃음도 우리들 얼굴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보현재를 지나면서부터는 별로 할딱이지 않아도 된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다. 어느새 빗소리도 그쳐 있다. 톡톡톡 들려오던 빗소리가 그치니 물소리가 힘차게 다가온다. 물소리를 따라 걷다가 개울을 만나 건너고 나니 중사자암 안내판이 보인다. 문장대는 1.3KM 남았다. 정상만이 목적이 아닌 만큼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한다.
중사자암(中獅子庵)은 지난번에 갔던 탈골암과는 달리 신도가 별로 없는 모양이다. 들어가는 오솔길을 풀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밟히지 않은 질경이가 참 통통하다. 그리고 여리다. 길지 않은 길에서 점점 의심이 생겨난다. 혹시 폐사지가 아닐까? 들어갈수록 기왓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길은 희미하기만 하다. 원래 상사자암과 하사자암도 있었다고 바랑 속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어쨌거나 가는 데까진 가보자는 각오 끝 저기에 조그만 텃밭이 눈에 들어온다. 피망과 고추가 자라고 있다. 폐사지는 아니다. 갑자기 초가집만한 바위가 길을 막는다. 막으면 돌아가야지 별 수 있나. 역시 바위는 몇 계단 놓여져 있는 옆쪽으로 갈 길을 인도하고 있다. 계단을 올라 절 마당으로 들어선다. 마당 귀퉁이에 장작을 팬 흔적이 역력하다.
별 장식 없는 절마당을 가로질러 본다. 인적이 없다. 법당 앞 댓돌 위에 앉아 다리를 쉬게 하는데 절 앞 모습이 참 좋다. 널따란 하늘을 바탕으로 히끗히끗한 바위산 봉우리, 푸른 산 봉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사진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습을 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사진 찍고 방으로 와서 차 한 잔 하세요.”
라는 말이 들려온다. 순간 몸이 굳는다. 한참을 돌아서지 못했다. 순간의 놀람과 갑작스런 반가움이 함께 여울졌다.
방으로 들어서는데 아랫목이 새까맣고 둥글다. 좀 전 옆 뜰에서 본 장작 패던 흔적과 교차된다. 장작 팬 자리를 유심히 보는 건 나의 버릇이다. 차마 내놓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곳은 내게 있어 갖가지 상상이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그런 장소이다. 갖가지 이미지가 피어나는 그런 곳.
아랫목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자리에 앉는다. “따뜻한가요? 스님?” 대답도 필요 없는 말이 불쑥 튀어나온다. 건네주시는 찻잔을 받으며 비로소 스님을 마주 본다. 바람처럼 스쳐지나갈 이방인을 못 본 척 소홀히 보내지 않고, 부처님의 품으로 불러들여 차 보시를 하고 있는 스님. 용케 알아보셨나? 알고 보면 스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중생이 얼마나 허기지고, 메마른 사람이란 것을? 또 자기 한계에 부딪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날개 다친 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매일 같이 허랑허랑 바랑하나 걸머지고 다닌다는 것을. 그러다 가끔씩 신들메를 고쳐 매는 척하며 눈물 한 번씩 훔쳐내곤 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는 얼굴에다 억지웃음 가득 지어낸다는 것을.
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찻잔 한가득 은유를 부어주신 스님은 건너편 산봉우리들을 손짓하며, 미처 묻지도 않은 보현과 문수보살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 둘은 부처님을 좌우에서 보시는 협시보살인데, 지혜의 보살인 문수는 사자를 타고 다니고, 서원을 상징하는 보현은 코끼리를 타고 다닌단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산은 문수봉이고 건너편 할딱고개(보현재)가 있는 보현봉은 코끼리봉이라고 부른단다.
한계는 밖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다가온다. 그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 사자 같은 용기로 넘는 걸까. 혹 사자와 한몸으로 다니는 문수보살의 지혜로 넘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땐 너무 가까이 와서 사람을 절망시키다가도, 넘자고 용기 있게 맘먹는 그 순간 이미 저만치 물러나 있는 게 한계란 것 아닐까. 용맹정진이란 바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닐까.
차 한 잔의 보시에다 문장대로 가는 지름길까지 덤으로 받고 다시 나서는 길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허랑허랑하게 걷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받은 세상의 모든 보시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행선지는 다시 속리산, 그중에서도 문장대. 솔직히 말해 초행길이다. 피치 못할 일거리 때문에 두어 번 천왕봉은 올라봤지만 번번이 무겁게 다녀왔던 발걸음이었다. 내려오는 즉시 글을 써야 했던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체질적으로 높은 산을 좋아하지 않는 다는 게 더 큰 이유였다. 땀이 나거나 숨이 차는 걸 몹시도 싫어하는 것도 병이라면 병일까.
 | ||
| ▲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 법주사 일주문. 오리숲으로도 유명. | ||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지난 주 탈골암을 다녀온 이후로 다시 속리산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계를 밟고 싶었다. 속리산은 내게 있어 줄곧 부담스런 대상이었다. 국보급 문화재가 우르르 모여 있는 법주사는 공부거리로서 무거운 곳이요, 잘 생긴 속리산 줄기 역시 생각만 해도 사뭇 나를 가위눌리게 했다.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게으름일 수도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용기 부족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인식을 하고난 다음에 할 일은 행동밖에 없다. 한계를 뛰어 넘고자 내미는 발걸음이라선지 몸이 가볍다. 하늘은 장마철 초입답게 잔뜩 찌푸리고 있는데 바람은 퍽 상냥하다. 대문간을 나서는 등 뒤에서 볼멘소리가 날아온다.
“이런 장마시기에 산엘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남편의 목소리다. 아마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주말인데 집에 좀 있지 않고.’일 것이다. 여느 때 같으면 떠나는 발걸음이 꽤나 불편했을 것이다. 가슴 한 자락이 묵직해지거나 살갗이 오소소 일어날 정도로.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 생애 처음으로 높은 산을 혼자서 올라보겠다는 날! 뜨거운 대지를 한결 누그러뜨리는 바람처럼 상냥해지기로 한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쯤 아마 나는 퍽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외다.’ 입안에 괴는 말도 단물처럼 달게 삼켜 버린다. 때로는 가장 가깝고 든든한 울타리가 외려 가장 높은 벽이 된다. 거창고등학교 교훈에도 있다지 않은가. “부모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 ||
| ▲ 한여름 깊은 숲속에서 피는 함박 꽃나무. | ||
혼자 걷는 길은 느리다. 세심정 휴게소에서 복천암을 지나 보현재까지 가는 30분 길도 느릿느릿하다. 보현재는 할딱고개라고도 불린다. 숨을 할딱할딱 쉬게 할 정도로 가파른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개 입구에 할딱재라는 팻말도 붙어 있다. 그런데 의외였다. 그다지 힘겹다는 느낌 없이 수월하게 올라온 듯하다. 비와 함께 시원하게 걸어와서 그런가. 한여름 짙푸른 숲 속에서 말갛게 피어나는 새하얀 함박꽃나무를 보며 천천히 올라와서 그런가. 별로 할딱이지 않았다.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문장대가 있다는데 멀게만 느껴지지도 않는다.
보현재 휴게소 평상에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무는데 뒤 이어 올라온 한 무리 등산객들이 아이스크림 값을 가지고 점방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하나씩 입에 물고 다시 산으로 들어간다. 그 뒷꼭지에 대고 청년과 그 어머니가 세상인심을 탄식한다. 지고 올라오는 수공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쯧쯧. 예전에는 속세를 떠난 사람들답게 술 인심, 아이스크림 인심이 꽤 후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쯧쯧.
그러고 보니 산길도 많이 메말라졌다. 예전에는 산을 오를 때, 내려오는 이들의 ‘수고하신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말 인심에서 발 힘이 다시 솟곤 했었는데, 이젠 손에 든 지도와 무표정한 이정표가 덕담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와 함께 생전 처음 보는 이들과 스쳐가며 씩 웃던 웃음도 우리들 얼굴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보현재를 지나면서부터는 별로 할딱이지 않아도 된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다. 어느새 빗소리도 그쳐 있다. 톡톡톡 들려오던 빗소리가 그치니 물소리가 힘차게 다가온다. 물소리를 따라 걷다가 개울을 만나 건너고 나니 중사자암 안내판이 보인다. 문장대는 1.3KM 남았다. 정상만이 목적이 아닌 만큼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한다.
중사자암(中獅子庵)은 지난번에 갔던 탈골암과는 달리 신도가 별로 없는 모양이다. 들어가는 오솔길을 풀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밟히지 않은 질경이가 참 통통하다. 그리고 여리다. 길지 않은 길에서 점점 의심이 생겨난다. 혹시 폐사지가 아닐까? 들어갈수록 기왓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길은 희미하기만 하다. 원래 상사자암과 하사자암도 있었다고 바랑 속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 ||
| ▲ 중사자암-작은 절이지만 법당안에 들어가보면 부처님 옆 한 켠에 책장이 짜여져 있어 이색적이다.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내속리면(內俗離面) 사내리(舍乃里) 속리산(俗離山)에 있는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法住寺) 소속 암자로 사자모양의 바위 위에 지어졌다. 720년(성덕왕 19)에 창건된 이래 1759년(영조 35), 1837년(현종 3), 1887년(고종 24) 등 3차례에 걸쳐 중수되었다. 6·25때 소실되었다가 1957년 중건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 법당과 삼성각이 있으며 법당 안에는 비로자나불과 후불탱화(後佛幀畵)가 봉안되어 있다. 그 밖에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사적비와 부도(浮屠) 1기가 남아 있다. 법주사박물관에는 조선 선조가 이곳에 원당(願堂)을 짓고 하사하였다는 어필 병풍이 보관되어 있다. 문수보살이 항상 머무르고 있다는 문수도량(文殊道場)으로도 유명하다. | ||
별 장식 없는 절마당을 가로질러 본다. 인적이 없다. 법당 앞 댓돌 위에 앉아 다리를 쉬게 하는데 절 앞 모습이 참 좋다. 널따란 하늘을 바탕으로 히끗히끗한 바위산 봉우리, 푸른 산 봉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사진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습을 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사진 찍고 방으로 와서 차 한 잔 하세요.”
라는 말이 들려온다. 순간 몸이 굳는다. 한참을 돌아서지 못했다. 순간의 놀람과 갑작스런 반가움이 함께 여울졌다.
방으로 들어서는데 아랫목이 새까맣고 둥글다. 좀 전 옆 뜰에서 본 장작 패던 흔적과 교차된다. 장작 팬 자리를 유심히 보는 건 나의 버릇이다. 차마 내놓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곳은 내게 있어 갖가지 상상이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그런 장소이다. 갖가지 이미지가 피어나는 그런 곳.
아랫목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자리에 앉는다. “따뜻한가요? 스님?” 대답도 필요 없는 말이 불쑥 튀어나온다. 건네주시는 찻잔을 받으며 비로소 스님을 마주 본다. 바람처럼 스쳐지나갈 이방인을 못 본 척 소홀히 보내지 않고, 부처님의 품으로 불러들여 차 보시를 하고 있는 스님. 용케 알아보셨나? 알고 보면 스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중생이 얼마나 허기지고, 메마른 사람이란 것을? 또 자기 한계에 부딪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날개 다친 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매일 같이 허랑허랑 바랑하나 걸머지고 다닌다는 것을. 그러다 가끔씩 신들메를 고쳐 매는 척하며 눈물 한 번씩 훔쳐내곤 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는 얼굴에다 억지웃음 가득 지어낸다는 것을.
 | ||
| ▲ 중사자암 건너편 바위산 할딱고개(보현재)가 있는 보현봉, 코끼리봉이라고 부른다. | ||
한계는 밖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다가온다. 그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 사자 같은 용기로 넘는 걸까. 혹 사자와 한몸으로 다니는 문수보살의 지혜로 넘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땐 너무 가까이 와서 사람을 절망시키다가도, 넘자고 용기 있게 맘먹는 그 순간 이미 저만치 물러나 있는 게 한계란 것 아닐까. 용맹정진이란 바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닐까.
차 한 잔의 보시에다 문장대로 가는 지름길까지 덤으로 받고 다시 나서는 길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허랑허랑하게 걷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받은 세상의 모든 보시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