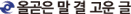| ||
개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 보다는 의원 유급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정비가 결정된 지 1년여만에 100% 인상 시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2배로 인상하면 의정활동도 2배이상 활발해 진다는 '보수 비례의 법칙'이라도 있다면 몰라도 말이다.
이른바 투자 대비 산출의 효율성인데, 공공예산의 집행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다. 최근 충주시의 전입자 포상금제 보도자료를 보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충주시는 전입자와 외지인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인구늘리기에 올인하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특히 충주시는 2004년 21만명 벽이 무너진 후 작년에도 20만6236명으로 2000여명이 줄어 들었다. 올 8월 현재 20만6272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회복세로 단정하긴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인구 20만명의 벽이 무너질 경우 지방교부세가 수십억원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충주시는 현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1만 4000명을 껴안기 위해 전입자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거부해온 사람들이 포상금 5만원에 마음이 동(動)해 동사무소를 찾아갈까?
지난 2005년부터 대학생 전입자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제천시의 사정을 보면 녹록치가 않다. 전입자 1명당 무려 50만원을 지원했으나 2005년 한햇동안 46명이 전입했고 반년만에 1/3이 다시 전출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이 일시적인 '미끼'가 됐을뿐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대학졸업후 탈(脫) 제천이 뻔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임시방편이었다. 50만원의 '미끼'가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충주시가 5만원짜리 '미끼'로 몇명의 전입자를 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양군은 이같은 이유로 전입 지원제를 진작에 중단한 바 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로 전입 포상금제를 내세운 충주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안타까움을 넘어 주민들의 짜증을 불러 일으킨다. 인구늘리기는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다.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든 아니면 여유계층이나 은퇴자들이 평온하게 눌러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 활기를 잃은 '죽은 도시' 만들기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234개 시·군이 한결같이 '기업하기 좋은도시' 를 내걸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그 길만이 대안일까. 유럽의 휴양도시들이 중소도시 못지않은 가구당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내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청주시가 유일하다.
공장 가동이 활발한 음성군, 진천군이 소폭 늘거나 정체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자립도 열악한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전입자 포상금 예산을 너나없이 세우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다.
인구늘리기 시책의 대표주자인 신생아 출산 보조금도 효율성에 의심을 받는 예산항목이다. 시·군이 경쟁적으로 나서다보니 10만원에서 시작한 보조금이 최근에는 아기용품을 포함해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출산 보조금이 인구증가에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쳇말로 '단체장 주머니돈이라면 그런 식으로 쓰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이야 의정비 인상시켜달라고 손벌린 원죄가 있으니 유구무언일 테지만…